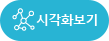| 항목 ID | GC04601240 |
|---|---|
| 한자 | 大靜鄕校 |
| 분야 | 종교/유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적/건물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 외 6필지 |
| 시대 | 조선/조선 |
| 집필자 | 송문기 |
| 건립 시기/일시 | 1416년 |
|---|---|
| 이전 시기/일시 | 1653년 |
| 문화재 지정 일시 | 1971년 8월 26일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대정향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
| 현 소재지 | 대정향교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번지
|
| 성격 | 향교 |
| 양식 | 전학 후묘 |
| 문화재 지정 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조선 시대 지방 관립 학교.
[개설]
대정향교의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으로 좌우에 4성위(四聖位)[안자·증자·자사·맹자]를 모시고, 동·서무(東西廡)에는 각각 송조 2현[주돈이·정호·정이·주희]와 동국 9현을 모셔 모두 5성 22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데, 소설위(小設位)에 해당된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는데 주로 안덕면과 대정읍의 유림들이 참여하고 있다.
[변천]
대정향교의 건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의 기사를 고려해 볼 때, 대정현이 설치된 2년 뒤인 1418년(태종 18) 또는 1420년(세종 2) 현성(縣城) 안에 세워진 듯하다. 1653년(효종 4) 목사 이원진(李元鎭)의 주도 하에 현재의 위치인 단산(簞山) 아래로 옮겼는데 현감 권극중(權克中)이 주관하고 강천로(姜天老)가 도감(都監)을 맡았다. 그 뒤 1669년(현종 10)·1688년(숙종 14)·1752년(영조 28)에 중수가 이루어 졌고 1772년(영조 48)에는 도감 이관(李寬)이 명륜당·전사청·서재(西齋)를 1835년(헌종 원년)에는 목사 박장복(朴長復)이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이후 1925년 명륜당이 중건되었고,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훈련병의 숙소로 이용되었다가 1978년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형태]
대정향교는 1,181평[부속지는 4,145평]의 부지에 구릉을 끼고 있어 전면에 강학 공간인 학당을 두고, 높은 뒤쪽에 배향 공간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밖으로는 외성(外城)이 둘러져 있고, 동남쪽과 서남쪽에는 각각 동정문(東正門)과 대성문이 있는데, 이들의 문을 들어서면 북향의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중앙에 큰 대청을 두고 있으며, 앞쪽[북쪽] 양쪽에 동재와 서재가 있다. 동재와 서재 앞쪽[북쪽] 한 단 높은 곳에는 내성이 둘러져 있고, 그 가운데에 내삼문이 있는데, 이 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성전이 자리잡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 기와지붕이며, 내부는 통 칸으로 장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현황]
대정향교는 현재 제주도 향교재단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어 있다. 향교에는 조선 시대의 각종 기록 유산들이 소장되어 있다. ‘명륜당(明倫堂)’ 편액은 1811년(순조 11) 현감 변경붕이 주자의 글씨를 본떠 쓴 것이고, ‘의문당(疑問堂)’ 편액은 훈장(訓長) 강사공(姜師孔)이 추사 김정희(金正喜)에게 글씨를 청하여 단 것이다. 소장 전적류로는 1670년(현종 11)~1811년(순조 11)까지의 『유안(儒案)』, 『유적(儒籍)』, 『전재임안(前齋任案)』, 『청금록(靑衿錄)』 등이 있다. 또 목판에 새긴 절목(節目), 중수기(重修記), 게시(揭示) 등이 전하는데 절목의 경우 액내유생과 청금유생 등에게 요역과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요 비석으로는 「목사 박공장복 존성애사비(牧使朴公長復尊聖愛士碑)」[1836], 「현감 권극중 존성흥학비(縣監權克中尊聖興學碑)」[1662], 「현감 김공재호 애사비(縣監金公在浩愛士碑)」[1827], 「현감 장공시열 존성애사비(縣監張公時悅尊聖愛士碑)」[1836], 「현감 송공두인 존성애사비(縣監宋公斗仁尊聖愛士碑)」[1894]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대정향교는 서귀포시 서부 지역 유림들의 활동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향교와 관련된 전적류와 고문서, 현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시대 대정향교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제주유맥육백년사』(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 『제주삼읍교학사료집』(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3)
- 『대정향교지』(대정향교지 편찬위원회, 2006)
- 『안덕면지』(안덕면, 2006)
- 『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붕 문집』(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문화재청: 대정향교(大靜鄕校)